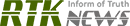![김기태 /사진=KIA 타이거즈 제공]](https://cdn.rightknow.co.kr/news/photo/201905/11585_8446_2254.jpg)
국내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수장이었던 김기태 감독이 ‘자진’ 사퇴했다.
프로야구 감독이 감독직을 내려놓을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경질’ 혹은 ‘자진 사퇴’. 사실 용어의 차이에 불과할 뿐, 그 둘은 동전의 양면이다.
경질이든 자진 사퇴든, 감독 본인으로선 ‘분노’ 혹은 ‘답답함’ 혹은 ‘미안함’의 정도가 최대치에 달했을 때 표현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렇다면, 김기태 감독 역시 ‘분노’ ‘답답함’ ‘미안함’ 사이를 오가다가 ‘자진사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면 될까…
사실, ‘주변에서도 예측가능한 객관적 상황’으론 특정인의 결정을 온전히 해명할 수 없다.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한 개인의 역사와 판단이 어우러져 ‘최종 결정’이라는 결과물은 탄생한다.
그러므로 ‘과연, 김기태 감독은 왜 자진 사퇴를 결정했을까?’라는 식의 질문은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다.
아니, 솔직히 난 그 부분에 대해선 그리 흥미가 없다.
오히려 난, 누구의 인생이든 가능한 결과물인 ‘자진사퇴’라는 개념이 갖는 속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야구 아닌 다른 종목으로 눈을 돌려 보니,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던 홍명보의 자진 사퇴가 떠오른다.
농구로 다시 종목을 변경해보니 농구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던 허재의 자진 사퇴가 떠올랐다.
요즘 ‘농구보다 뜨거운’ 배구로 눈을 돌려보니 얼마 전 벌어진 사태였던, 김호철 배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자진 사퇴가 떠오른다.
내가 너무 극단적인 예만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사례는, ‘자진 사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자진’이라는 말이 얼마나 그것의 본질적 성격과 어울리지 않는 용어인지 알려준다.
기본적으로 ‘자진 사퇴’라는 단어에는 폭력성이 담겨 있다.

일단, 감독이 ‘자진 사퇴’라는 결정을 하는 순간, 그러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당사자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여기서 말하는 압박은 그야말로 전방위적 압박이다.
아마도, 팬들은 감독을 향해 독기를 품은 채 손가락질 하고 있을 테고, 구단 고위 관계자는 ‘이 난처한 상황을 감독이 알아서 끊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을 테고, 선수들은 선수대로 감독을 향해 불만을 품고 있을 거다.
이 모든 요인이 감독을 완전히 에워싼 상태에서, 감독은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선택지는 별로 없다.
첫 번째 선택지는 좀 더 버티다가 ‘경질’을 당하는 것. 두 번째 선택지는 추한 꼴을 보기 전에 ‘자진사퇴’를 하며 자존심이라도 지키는 것이다.
‘자존심 강한’ 김기태 감독은, 자진사퇴를 결정했다.
쌍방울 레이더스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화려했던 현역 시절을 고려했을 때, 그가 ‘유보된 타살’이 아닌 ‘자발적 죽음’을 택한 건 충분히 납득할만하다.
현재, 김기태 감독 관련 기사에는 당연히 ‘댓글 융단폭격’이 가해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아 타이거즈와 거친 이별을 해야 했던 임창용의 인터뷰가 최근 파문을 일으키며 김기태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임창용의 발언만으로 김기태의 모든 것을 평가할 순 없지만, 임창용 인터뷰의 몇몇 대목은 감독 김기태를 향해 아쉬운 마음을 품게 한다.
그러나, 김기태를 향해 가해지는 이 가혹한 비판은 전혀 달갑지 않다.
난 이런 식의 ‘만남과 헤어짐’이 일종의 안 좋은 습관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이다.
팬들은 보통 새로운 감독이 오면 열광하든, 아니면 맹렬히 비판한다.
그래도 성적을 올려놓으면 ‘찬사’를 보낸다. ‘그래, 내가 널 믿지 못했지만, 너 그래도 괜찮다’ 혹은 ‘역시 예상대로 넌 대단해’라는 식의 찬사다.
성적이 떨어지면 다시 ‘맹비난’이 이어진다. 그리고 성적이 떨어져 도저히 오를 기미가 안 보이는 순간, 팬들은 감독을 향해 융단폭격을 퍼붓는다.
결국, 감독은 팀을 떠난다.
팬들에게 감독은 ‘너 같이 몹쓸 놈은 진작 팀을 떠났어야 하는 원흉’인 셈이고, 감독에게 있어 팬은 ‘조울증에 가까운 감정 기복을 보여주는 인내심 없는 인간들’인 것이다. 물론, 그 두 당사자 사이엔 사랑도 있고 추억도 있겠지만, 헤어질 때 그 둘은 진흙탕 위에 누워있는 스스로를 발견해야 한다.
명저 <야구란 무엇인가>를 쓴 ‘레너드 코페트’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어떤 감독은 아무런 차이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 어떤 감독은 질 뻔한 게임을 몇 차례 승리로 바꿔 놓는다. 어떤 감독은 가만히 내버려 두었더라면 이길 수 있는 게임을 공연히 주무르다가 망쳐 놓는다. 문제는 시험 대상에 오른 감독이 어떻게 팀을 이끄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감독은 팀 승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연간 풀시즌을 치르면서 각 팀이 보유한 기본 전력이 성적에 고스란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감독이 동일한 결정을 내리거나, 누가 감독을 맡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선수들의 능력을 총체적으로 뭉뚱그린 전력으로 보자면 스타일이 다른 감독이 팀을 이끈다 해도 결과는 비슷하다는 얘기다.”
1982년에 국내 프로야구가 시작됐으니, 횟수로 어느새 38년째다.
난, 프로야구 팀을 맡은 감독이 자진사퇴하는 방식, 그리고 그것이 이뤄지기까지의 과정이 여전히 아쉽다.
감독과 팬 사이의 ‘건강한’ 이별은, 여전히 머나먼 과제인 것인가.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RTK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