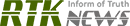여느 날과 다를 것 없는 퇴근 시간. 조금 전부터 한 청년이 내 뒤를 따라오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얼핏 보니 키도 크고, 특이한 분홍색 모자까지 스타일이 꽤 좋다.
정말 나를 따라온 것일까? 난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순간 당황했는지, 그는 손에 든 폰에 코를 박고는 내 앞을 지나쳐 휙 지나간다. 그런데 아뿔싸 그는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양배추에 발이 걸려 휘청거렸다.
발에 차여 이리저리 굴러가는 양배추들을 잡으러 그는 허둥거리며 뛰기 시작했다.
이윽고 채소가게 아저씨의 등장, 사방으로 굴러다니는 자신의 양배추에 시선을 던진다. 벌어지고 있는 풍경이 비현실적이어서일까? 의외로 태평한 표정이다.
청년은 연신 ‘죄송해요’를 외치며 양배추를 쫓는다. 눈앞에서 순간적으로 펼쳐진 이 슬랩스틱 코미디에 내 몸이 먼저 반응했다.
잽싸게 달려가 떼굴떼굴 굴러가던 양배추 하나를 붙잡았다. 그리곤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외쳤다. “아저씨 여기 양배추요!”
길을 걷다 보면 사람이 걷는 보도에 과일 상자나 채소 등을 내놓은 청과물 가게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겨울이 되어 김장용 배추를 판매하면 더 넓은 면적을 사용하고, 그렇다 할 계절 채소가 없을 때는 또 그만하게 사용하며 매일매일 그 가게가 점유한 보도의 면적이 달라진다. 그것이 적어도 3평은 될 것이다.
청년은 미안해 했다. 청년의 반응이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라도 그와 비슷하게 반응했을 것이다.
공공의 공간인 인도 위에 맘대로 놓인 양배추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말이다. 이처럼 우리는 거리의 비합법적 공간 점유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네 것이냐 내 것이냐 따질 수 없는 모호한 공간의 특성상 얼만큼의 점유까지 암묵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의 경계는 모호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암묵적인 동의의 관대함은 어디를 점유하느냐에 따라 ‘그럴 수도 있지’에서 ‘절대 그럴 수 없어!’로 180도 달라진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농경지를 중심으로 이웃과 마을이 형성되는 촌락 공동체 사회였다.
아침이면 둘러앉아 나물을 다듬고, 누구 집 자식 상관없이 뛰어놀며 결혼식까지 열렸던 곳이 바로 앞마당이었다.
‘절대 점유할 수 없어!’라는 단호한 비동의는 ‘공동체’와 ‘앞마당’ 이 사라져버린 우리의 주거공간에서 날카롭게 나타난다.
이 시대에서 내 왼쪽 오른쪽 그리고 위아래에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이웃’ 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뉴스에서 아파트 복도에 시래기를 널어놓는 이웃과의 갈등을 다룬 것을 본 적이 있다.
시래기를 널어놓는 이웃은 어차피 우리 집 복도이니 나의 것이기도 하다며 본인의 행동을 변호했고, 주변 이웃들은 네 것 내 것이 어딨냐며 이 공간의 모호함에 대해 소리쳤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내 집 앞 공간은 나의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매일 걷는 출퇴근길의 양배추는 괜찮고, 아파트 앞에서 말라가는 고추는 용납할 수 없는 극명한 인식의 차이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공짜로 얻는 것과 내가 값을 치르고 구매한 것 중, 사람들은 당연히 후자를 더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 노력한다. 때문에 ‘공공’이라는 단어가 붙은 곳을 둘러보면 대부분 얼마 가지 않아 제 모습을 잃는다.
이처럼 공공의 범위에 있는 길거리와 골목에서 일어나는 무단점유에 사람들이 더 관대한 이유는 ‘내가 직접 돈을 내지 않고 사용한다.’라는 인식 때문이다.
대한민국 절반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매일 일어날 이웃 간 아슬한 줄타기는 앞으로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다.
‘우리’의 공간은 사라지지만 무단점유에 대한 암묵적인 이해를 바라는 인식은 끊임없이 계승되고 있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될 것이다.
시민의 의식이 바뀌는 속도가 거북이라면, 우리의 주거형태는 하이에나와 같은 속도로 변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인식의 층위가 서로 부딪치기도 하는 것이다.
공용공간에 대한 합의되지 않은 점유라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의 집행과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마치 무제한의 혐오가 허용되기라도 한 듯이 SNS상에서는 이에 대한 온갖 조롱과 모욕이 퍼부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이 과연 모두가 만족하는 ‘우리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궁극의 해결책일까? 햇볕 좋은 며칠 동안 아파트 주차장에 고추를 널어놓는 할머니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까?
낚시꾼들의 쓰레기 처리 방식이 눈에 거슬린다며 수 백년 동안 낚시터로 유명하던 천변을 갑자기 낚시금지 구역으로 정해버린 어느 기업가 출신 시장도 있었다. 당연히도 그는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다.
아무튼, 이런 금지의 방식만이 모두가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길은 아닐 것이다.
법과 엄정함 이전에 존중이 먼저여야 한다. 사람과 계승된 전통에 대한 존중 말이다. 우린 이 간극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야만 한다.
*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RTK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