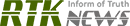내가 프랑스에서 절망했던 건, 낯선 환경과 사람들 때문이 아니었다.
그날 멍하니 누워 나의 무쓸모함을 느끼고 있었다. 저무는 해를 따라 움직이는 햇살 한 줄기가 마침 누운 자리 위로 뻗쳤다.
햇살을 확대경 삼아 본 밀폐된 공간에서조차 먼지들은 끊임없이 부유하고 있었다. 미동도 없이 누워 뱉어낸 숨이 만들어낸 현상일까, 어디선가 미세하게 새어들어 나오는 바람의 영향일까.
내 안에는 그 어떤 동인도 없는데 무생물인 먼지조차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순간 먼지보다 열등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다. 벌떡 일어나 온 창문을 활짝 열었다. 창밖에는 아름드리 나무에 따끈한 초록 잎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눈물이 났다. 저 여린 잎들도 제 태어날 때를 알고 단단한 나뭇가지를 밀고 나오는데 나는 왜 삶을 밀고 나가지 못하는지 말이다.
철이 지날 무렵이 되면 미련 없이 더운 바람과 햇살을 쫓아가는 그 생이 부러웠다. 나를 감싸주는 그런 다정한 바람과 따스한 햇살 같은 누군가가 필요했다.
해미는 도시가스 폭발 사고로 언니를 잃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 엄마와 아빠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다.
아빠는 부산으로 그리고 엄마는 해미와 동생 해나를 데리고 신학 공부를 위해 독일로 떠났다. 독일 G시엔 엄마의 언니, 파독 간호사로 나가 의사가 된 행자 이모가 살고있다. 해미는 적응을 하기 위해, 실은 엄마가 걱정하지 않도록 나름의 노력을 한다. 해미의 서걱거림을 이모는 알아차린다.
이모는 해미가 ‘해미’일수 있도록 살며시 마음을 보살폈다. 이모는 자신과 같은 시기에 독일에 건너와 간호사로 일한 동료의 딸인 레나를 해미에게 소개해 준다. 레나를 통해 한수도 알게 된다. 친구들 덕분에 해미는 삶의 온기를 찾아간다.
때로는 자신의 평범한 행복에 멈칫하기도 하지만 서서히 독일에서의 삶에 적응해간다. 한수의 엄마인 선자 이모는 뇌종양 투병 중이다. 한수는 엄마를 위해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어 한다.

독일에서 나고 자라 한국어를 모르는 한수는 엄마의 지난 일기장을 해미에게 건넨다.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한수에게 셈이 나기도, 부탁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가족을 잃는 슬픔을 아는 해미는 그를 돕는다.
세 친구는 해미의 소설 쓰기를 가장해 선자 이모의 첫사랑 찾기 프로젝트에 돌입하지만 좀처럼 진척되지 않는다. 그러던 중 1997년에 일어난 외환위기로 해미는 급작스럽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며 프로젝트는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해미는 너무 착해서 거짓말을 했다. 또다시 슬픔에 무너질지 모르는 엄마를 위해, 저 먼 한국에서 나를 걱정하는 아빠를 위해,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은 선자 이모와 한수의 간절함을 위해. 타인의 색이 입혀진 해미의 마음은 힘들었을 것이다.
매일 해가 떠오르면 생생한 기억도 햇빛에 색은 옅어지고 바라진다. 칠은 금이 가고 파편이 되어 떨어졌지만 형상만큼은 해미의 마음에 고스란히 묵직한 무게로 남아있었다. 타인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건 그 사람만 속이는 게 아니다. 거짓말을 지어내고 정말 그러한 것처럼 연기하는 일,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본래의 선한 취지는 퇴색되고 자신 역시 그 거짓에 갇히고 만다.
해미는 ‘자기다움’을 경험하지 못한 채 자신의 삶 속에서 이방인처럼 어른이 된다. 그런 해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우재가 있다.
우재는 해미에게 한결같이 안부를 묻고 소소한 자신의 일상을 나눈다. 해미의 단단한 벽에 끊임없는 가벼운 노크로 우재는 균열을 낸다. 그런 우재 덕분에 해미는 용기를 내어 봉인된 상자를 꺼내 마주한다. 그제야 해미는 애써 외면했던 이들과 또 자신에게 진정으로 가닿는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상처를 홀로 이겨내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 가혹하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무리 지어 살아온 인류의 역사가 그 사실을 증명한다. 우리는 함께 기대어 산다.
아픔을 기꺼이 감당하려는 서로의 마음이 포개어질 때, 상대의 쓸쓸한 눈빛을 애틋한 눈빛으로 흠뻑 껴앉을 때, 당신과 내가 아닌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고된 인생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백수린 작가의 첫 장편소설 〖눈부신 안부〗의 해미를 마주하며 나는 참 많이 미안했다. 그가 소설 속 허구의 인물인 걸 알면서도 지난날의 나에게 또 미처 안부조차 묻지 못한 수많은 해미가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 미안하고 빚진 마음이 가득한 상태에서 공백이 길어지면 쉬운 안부를 묻는 것도 참 어렵다.
이 책을 읽으면 갑자기 없던 힘이 불쑥 생긴다. 작가는 “이 책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잘 가닿아 눈부신 세상 쪽으로 한 걸음 나아갈 힘을 줄 수 있었으면”한다고 했다. 그 힘에 기대어 독자분들도 ‘눈부신 안부’를 전해 보시기 바란다.
한민희 서평가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RTK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