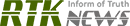『높은 자존감의 사랑법』은“나를 지키는 사랑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져 놓고, 이에 대해 여러 갈래의 길을 찾아가는 정아은 작가의 책이다.
그러게나 말이다. 어떻게 가능할까? 그 문장을 읽으며 처음 든 생각은 ‘사랑이 무슨 질병인가?’ 였다. 사랑이라면 뭘 지키고 말고 할 것 없이 그냥 뛰어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했던 거다. 하지만 그건 1인칭의 경우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했다.
‘만약 내 딸이라면 앞 뒤 가리지 말고 무작정 사랑에 뛰어들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나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제 ‘적당히’가 없다. 웬만하지가 않다. 목줄에 매여 좁아터진 영역에서 평생 먹고 자고 싸야만 하는 개들처럼 모두가 사나워졌다.
당연히 연애도 위험해졌다. 사랑하다 헤어지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할만큼의 각오가 필요할 때도 있다. 연애를 하다가 죽는 사람들의 소식이 날마다 뉴스에 넘쳐난다. 도대체 사랑이 얼마나 위험해진 걸까?
2013년 한겨레문학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등장한 정아은 작가, 지난 10여 년 동안 왕성한 작품활동을 했다. 장편소설 『그 남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어느 날 몸 밖으로 나간 여자는』, 『잠실동 사람들』, 『모던하트』, 『맨얼굴의 사랑』… 여기에 더해 『엄마의 독서』, 『당신이 집에서 논다는 거짓말』와 같은 산문집도 펴냈다.
2023년에는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이라는 정치사 책을 펴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높은 자존감의 사랑법』에서 작가는 본격적으로 사랑 그 자체를 주제로 삼아 사유를 펼친다.
주위를 돌아보면 사랑 때문에 삶이 부서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 사랑이 남긴 깊은 상처와 두려운 경험 때문에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많다. 작가는 바로 그런 이들에게 지성으로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공포영화를 제작하는 세트장을 본다면 누구라도 두려움이 아닌 흥미부터 느낄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랑의 본질과 연애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면 더는 두려움을 갖지 않을 것이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물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타의에 의해 못하는 것과 자의에 의해 안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나쁜 상대나 나쁜 연애의 기억 때문에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병든 마음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어떤 식으로든 상처는 치유가 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 새로운 사랑을 할지 말지는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면 된다. 온전한 상태로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책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작가가 이 책을 통틀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가장 함축적으로 묘사한 대목이다. “한 사람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 기간 나의 삶은 바뀐다. 그리고 그 사랑이 끝날 때는, 낯설었던 대상에 대한 ‘커다란 앎’이 내 안에 들어차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사랑이라는 강렬한 감정을 잃은 대신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앎을 얻는다. 그렇기에 사랑은 사건이다. 다른 생명체가 내게 주는, 동시에 내가 내게 부여하는, 가장 커다란 사건이다.
”작가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의 경우를 사례로 들어 짝사랑에 대한 생각을 펼친다. 작가는 짝사랑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만큼 사람을 누추하게 만드는 것도 없다면서. 자존감을 잃기도 쉬우며, 소모적인 감정들 속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처를 얻기도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기감정을 직시하고 그 감정을 만들어내는 요인을 한 발짝 떨어져 볼 수 있는 지성이 있을 때, 우리는 짝사랑이 주는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사랑을 잃는 일, 즉 ‘실연’의 진면목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꽤 된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거나 사랑이 끝남으로써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와 달리 사랑을 잃는 실연은 때로 사람의 마음을 일그러트리기도 하고, 삶을 통째로 망가뜨리기도 한다.
작가는 실연의 심정을 이런 문장으로 표현한다. “사랑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일상을 산산이 분해한 뒤 그 조각을 일제히 그 사람에게 던져 넣는다.
나를 둘러싼 사물, 기후, 인간, 비인간 생명체, 지나온 내 삶의 역사, 공동체의 역사를 모두 해체해 그 사람과 결합시켜 재탄생시키면서, 급격하게 내 안에서 빠져나간다.
당사자인 두 사람이 각각 제 몸에서 빠져 나와 자신을 이루던 모든 것을 해체한 뒤 상대의 것과 합쳐 조합해내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새로운 두 개의 인격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다.”
정아은 작가는 실연에 대해 말하고는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추하고 무엇이 아름다운가?’ 작가는 실연에 대처하는 방법에 정답은 없다고 말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실연 앞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그 최선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가장 깊은 슬픔 속에 빠져 버둥거리면서도 최선을 다해 지나간 연애를 되새김질해보는 것.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연애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 정아은 작가의 조언이다.
이 책은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보게 한다. 이를 통해 무엇이 내 의지로 할 수 있었던 일이고 없었던 일인지를 분류할 수 있게 된다.
그럼 필요 이상으로 죄책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에 빠져드는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일수록 내가 나를 존중하는 감정, 즉 자존감은 탄탄히 쌓이게 된다고 작가는 말한다. 사랑을 잃는다 해도, 깊이 상처받아도, 당장 죽을 만큼 가슴이 아파도, 우리는 어떡하든지 그 사랑 이전보다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책을 열 때 작가가 했던 약속 그대로 책을 다 읽고 나면‘나를 지키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이 축복처럼 전해지길 빈다.
김성신 출판평론가,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겸임교수
*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RTK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