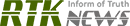이지아 시인의 「상계동」은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이 사는 집은 “비닐 하우스”입니다. “엄마”는 생계를 위해 “비닐 하우스”에서 채소를 키웁니다. “노름에 빠진 아빠”는 가족을 돌보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슬픔”을 배우지 못한 “나”는 가난의 “운명”이 무엇인지 아직 모릅니다.
“비닐 하우스”는 가난의 상징입니다. “잘 들리고, 잘 보이고, 무섭고, 부끄러웠다”는 말은 가난으로 인한 불안과 수치를 고백합니다. 가난은 위태롭습니다. 방어할 수 없는 허약함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비를 가졌고 별이 뜨면 별을 가졌지”라는 말은 더는 낭만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가난이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가난을 짊어진 엄마의 얼굴엔 감정이 없습니다. 고통도 비명도 사라졌습니다. 절규와 절망도 발설하지 않습니다. 마치 엄마의 “채소들”처럼 생명이지만, 생명력 없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묶여 있던 개”처럼 참담합니다.

「상계동」은 살풍경한 가난의 서사를 보여줍니다. 눈물과 표정이 말라버린 세상입니다. 시인은 가난을 ‘선악’의 문제로 그리지 않습니다. 막연한 기대와 희망으로 덧씌우지 않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실존은 곧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가난의 비극은 작고 약한 존재들이 먼저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가난의 끔찍함은 오늘의 가난이 내일도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파리 같은 집을 구하러 심약한 숲속으로” 떠나는 “나”의 걸음은 안쓰럽고 눈물겹습니다.
이지아 시인의 세 번째 시집 『아기 늑대와 걸어가기』(민음사, 2023)는 익숙하고 친숙한 곳으로부터 예기치 않은 장소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희곡을 공부하며 시의 지평을 넓혀 온 시인의 개성은 불현듯 등장한 연극 무대처럼 새로운 곳으로 독자를 데려갑니다.
시집 자서(自序)에서 시인은 “나는 BC 390년에서부터 날아온 시의 구름을 찾아 서정시, 서사시, 극시의 형태를 미약하게나마 시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시집은 장르적 고민, 형식적 실험, 떠도는 사유가 녹아있습니다. 시공간 이동의 상상은 물리적 제약에서 일탈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낯선 상상으로의 초대입니다.
시인이 그린 「상계동」의 풍경에서 김동원 감독의 다큐멘터리「상계동 올림픽」(1988년)을 떠올렸습니다. 1986년 6월 26일 상계동 173번지의 판잣집 철거 사건을 생각했습니다. 폭력이 가난을 압살한 자리입니다. 무수한 현재가 과거를 지웁니다. 가속의 현실이 기억을 말살합니다. 어쩌면 시인은 지나간 시간과 기억을 반추하기 위해 싸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불온한 현실에 대한 저항일 수도 있으니까요.
강경희 문학평론가 · 갤러리지지향 대표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RTK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